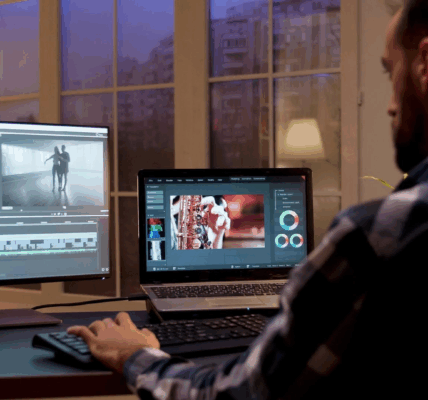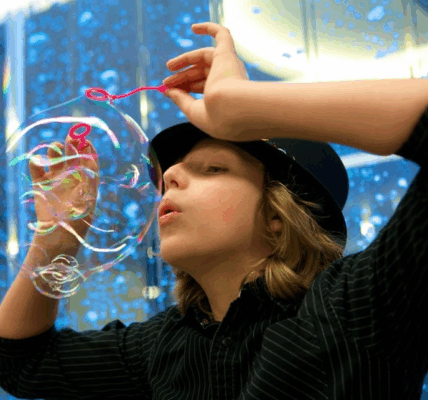새콤한 게 맛있긴 한데… 왜 어떤 건 텁텁할까?
우리는 발효된 음식을 자주 접한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막걸리까지. 이들은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숙성되고, 그 안에서 생긴 산미가 풍미를 만든다. 하지만 발효된 음식이 항상 맛있는 건 아니다. 어떤 김치는 너무 시어서 입 안에서 혀를 찌르고, 어떤 막걸리는 시큼한 맛과 함께 텁텁한 감촉이 남아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는 “좀 덜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거나 “이건 너무 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맛을 제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가 가장 맛있는 시점인가’를 파악하려면 수많은 경험과 실험이 필요하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발효 도중 산미의 흐름을 읽고, ‘덜 시고, 덜 텁텁한’ 이상적인 맛을 설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발효 산미 조절 전문가다.

감각은 감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치와 시간으로 관리하는 미각
발효 전문가의 세계에서 산미는 단순히 ‘시큼한 맛’ 그 이상이다. 예를 들어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pH 수치를 낮추고 신맛을 유발하는데, 이 산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다’는 느낌이 들고,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텁텁함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맛은 수치로 표현하면 pH 4.2 이하에서 나타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쾌한 신맛’은 수치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발효 미각 전문가는 기계로 산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과 코, 손끝으로 감각적인 기록을 병행한다. 같은 pH 수치에서도 어떤 발효균을 사용했는지, 숙성 온도가 몇 도였는지, 원재료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산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품을 맛보고, 그 안에서 미세한 단맛과 신맛, 산도와 향의 균형을 읽어낸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다음 발효를 위한 데이터, 다시 말해 ‘맛의 설계도’로 활용된다.

모든 발효에는 ‘덜 익었을 때가 더 맛있는 순간’이 존재한다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오래 묵힐수록 맛이 깊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발효의 정점은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머문다. 김치는 담근 지 5일째가 가장 이상적인 산미를 가질 수도 있고, 요구르트는 36시간 숙성보다 30시간 숙성이 혀에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타이밍은 절대 기계로 예측할 수 없다. 냉장 숙성인지 실온인지, 고춧가루의 종류는 어떤지, 유산균의 생존율이 어떤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효 산미 전문가들은 이 짧은 타이밍의 차이를 정확히 감지하고, 제품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시킬지, 혹은 다음 공정으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그 판단이 바로 그 제품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숙성이 조금만 더 진행돼도 향이 무거워지고, 단맛이 사라지며, 불쾌한 신맛이 입 안에 오래 남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고 맛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한눈에 보는 발효 산미 조절 전문가의 일
| 항목 | 내용 |
|---|---|
| 직업명 | 발효 미각 전문가, 산미 조절 기술자, 관능 평가 테스터 |
| 주요 업무 | 발효 도중 산도·맛의 변화 추적, 적정 숙성 시점 판단, 산미 완화 기술 적용 |
| 수입 수준 | 프로젝트당 30만~100만 원 / 식품회사 품질 담당자 연 3500만~6000만 원 |
| 필요 역량 | 미각·후각 민감도, 발효 생물학 이해, pH 측정 및 시감각 판단 능력 |
| 활동 분야 | 전통식품 제조사, 발효 연구소, 식품 R&D 부서,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등 |

맛은 감각이지만, 그 감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기술이다
산미 조절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단순한 테이스팅이 아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맛이 빨리 사라지고 산미만 남는다”는 느낌을, 그들은 “후각 자극이 혀보다 앞서며 pH는 4.5 이하, 유산균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이라고 정리한다. 이런 분석은 품질관리 보고서에 담겨, 제품 개발팀에 전달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산미가 너무 도드라져 시장 반응이 나빠졌다는 피드백을 분석해, 다음 생산 시 발효 시간을 줄이거나 발효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즉, 이 직업은 맛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제품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각 중심의 품질 기술자인 셈이다.

입에서 ‘딱 좋은 맛’을 만드는 직관과 과학의 경계
소비자 대부분은 “맛있다”, “좀 시다”, “이건 깔끔하다”는 식의 주관적 표현만 남긴다. 하지만 그 뒤엔 누군가가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딱 거기까지는 괜찮고, 거기서부터는 불쾌하다는 경계를 정해놓는다. 그것이 바로 산미 조절 전문가의 역할이다. 시큼한 맛을 내면서도 텁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김치는 절임부터 양념의 농도, 숙성 온도까지 정밀하게 조절되어야 하고, 막걸리는 효모 활동 속도와 병입 시점까지 계산해야만 부드러운 산미가 완성된다. 이 모든 복잡한 변수를 사람의 혀로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화하여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직업의 본질이다.

맛이 자연스럽게 익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설계한 사람
누군가는 말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발효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맛의 방향은 인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너무 익으면 버려지고, 너무 덜 익으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간, 가장 맛있는 타이밍에 제품을 멈추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 타이밍을 찾아내는 감각과 경험, 그리고 수치적 데이터가 모두 요구되는 직업. 바로 산미를 조절하고 맛을 다듬는 발효 미각 전문가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거 딱 좋아”라는 말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다. 아무리 발효가 자연의 일이라도, 그 맛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의 감각과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사람, 그 직업은 바로 발효 산미 조절 전문가다